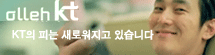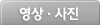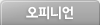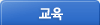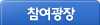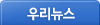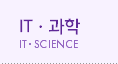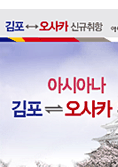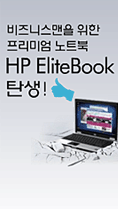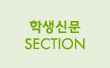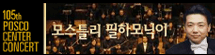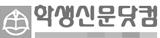15.5%, 15.3%, 17.2%, 21%, 12.3%
지금까지 우리가 치룬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다.
서울 15.5%, 부산 15.3%, 충남 17.2%, 전북 21%, 경기 12.3%로 전체 유권자의 1/4이상이 참여한 선거는 없었다.
오는 29일 치러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와 경북 교육감 선거 역시 불행이도 위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토록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인 국민에게 외면 받는 이유로는 우선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듯 하다.
서울시교육감선거를 제외하고는 언론에서도 선거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자연스레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선거가 되어버리고 있다.
선관위 차원에서도 언론을 비롯한 홍보방법을 따로 연구해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 속에 치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와 정부만 탓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이 박지성 선수 앞에서 축구를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은 교육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교육정책이 엄마를 이긴 적이 없다는 말처럼 말이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무장은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교육감 선거에서 지금과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교육감 선거가 마치 정치판의 선거와 같이 변질되어 버리고 있는 실정에서 유권자에게 투표만을 강요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과 아이들을 위한 대안은 없고, `전교조타도', `MB교육 심판'이라는 정치적 논리 안으로 들어가 버린 지금의 현실과, 상호비방이 난무하고, 오로지 이념대결로만 계속된다면 지금과 같은 무관심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거도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만은 아이들과 함께 두 손잡고 투표소에 가야한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시작인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자가 주장하는 바를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어떤 후보가 소비주체인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감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선거가 이루어지고, 아이들과 함께 투표소로 간다면 앞으로의 교육감 선거는 절대로 이념대결로 흐르지 못할 것이다.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거창한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교육감 선거는 대선, 총선만큼이나 중요한 선거다.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결정하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부모지만 선거의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거를 통해 교육이 이념대결이 아닌 정책대결로 유권자들이 선거를 옮겨야 한다. 유권자의 힘과 아이들의 힘으로 교육을 바꾸어야 한다.
일부 특정세력과 특정 정치집단에 더 이상 이 나라의 교육을 맡기고, 국민들은 사교육에만 열을 올린다면, 100년이 지나도 이 나라 교육은 지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